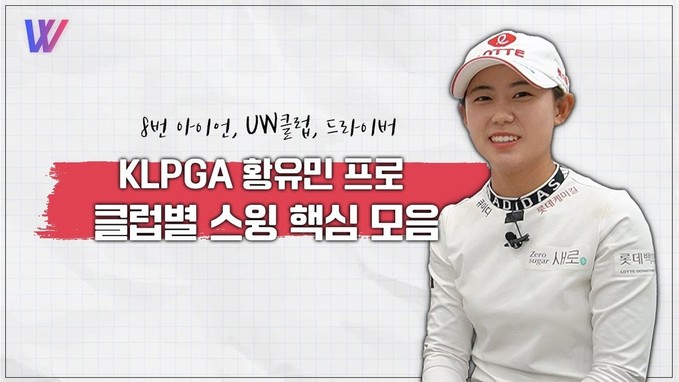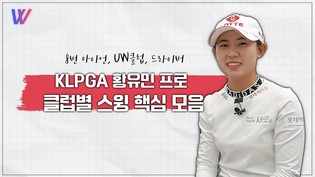[스포츠W 임가을 기자]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개봉을 앞둔 가운데,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을 필두로 한 제작진이 선보인 독특한 연출과 이에 포함된 의도가 화제를 모은다.
헤트비히 회스(산드라 휠러)가 풍성하게 가꾼 정원의 반대편에는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다. 회스 부부는 집 외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다.
 |
| ▲ 사진=찬란 |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이런 섬뜩한 느낌의 구획 분리와 폐쇄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영화의 각색 방향을 잡아갔다. 감독이 “실제 회스 부부의 삶에 존재했던 구획화와 그들이 옆에 두고 살아간 공포를 강조하고자 했다”고 연출 의도를 밝힌 것처럼 영화 속엔 이러한 개념들이 수시로 등장한다.
루돌프 회스(크리스티안 프리델)가 출근하기 전, 헤트비히와 아이들이 준비한 깜짝선물을 보기 위해 눈을 가린 채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은 루돌프가 직장에서 하는 일을 비틀어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또, 루돌프 회스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집 안의 문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닫고 잠그는 행동을 하는데, 가정의 아늑함과 막연히 밀려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면들이 영화 속의 영화라고 강조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루돌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신경 쓰는지, 우리라면 누구를 중요하게 여길지 생각해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철학자 질리언 로즈가 쓴 아우슈비츠에 관한 글을 통해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영화’를 상상했다는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해자 문화에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주고 싶었으며 마냥 차가운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들여다보게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리얼하게 구현하기 위해 와이드 렌즈와 기하학적으로 대상을 중심에 놓는 프레임을 사용, 인물들과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는 아름다움과 같은 것을 전부 제거하려는 목적에도 적합했다.
파벨 포리코브스키 감독의 ‘이다’, ‘콜드 워’ 촬영감독인 우카시 잘은 촬영 과정에서 대부분 자연적인 빛, 혹은 영화 속 시간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광원을 활용해 작업했다. 우카시 잘은 “미화하는 건 허용되지 않았다. 색을 보정하는 과정에서도 단조롭게 느껴지도록 했으며 이미지를 잘 다듬었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회스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촬영 공간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숨겨놓은 뒤, 긴 테이크를 이어가는 방식의 촬영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는 정밀하고 물리적으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었고,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는 따로 마련된 콘크리트 벙커에 자리를 잡고 원격 케이블 시스템을 통해 작업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카메라가 무엇을 찍을 건지 잘 판단해 정확한 디렉션을 내려야 했다. 콘티 없이 온전히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을 위해 프레임에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잊지 않았고, 배우들의 동선을 따라가기도 했다.
극 중 헤트비히가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루돌프는 소각로 기술자들과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수용소의 나치 친위대 장교들이 마당에 모여들고, 가정부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상황들은 동시에 촬영된 장면이다.
모니터 10대를 앞에 두고 전체 촬영을 컨트롤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정신없고 답답한 상황이 고스란히 영화에 묻어나왔다. 모든 장면에서 균일한 톤이 느껴졌고, 감히 다른 방식으로 촬영해서는 담아낼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고 전했다.
우카시 잘 촬영감독 역시 결과물에 매우 흡족해하며 “사람들이 ‘혁신적’이라는 말을 흔히 쓴다. 이 영화가 바로 이 단어와 어울리는 작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담장 밖, 수용소 책임자 루돌프 회스 장교 부부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공포를 전하는 영화로, 오는 6월 5일 개봉한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KLPGA] 박현경, 타이틀 방어-시즌 4승 도전 출사표 #덕신EPC서울경제레이디스클래식](/news/data/20241025/p179571002912299_460_h2.jpg)
![[온앤오프] 신인상 조기 확정! '루키 메이저 퀸' 유현조프로의 솔직 발랄한 인터뷰???? #KLPGA](/news/data/20241024/p179578202978085_835_h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