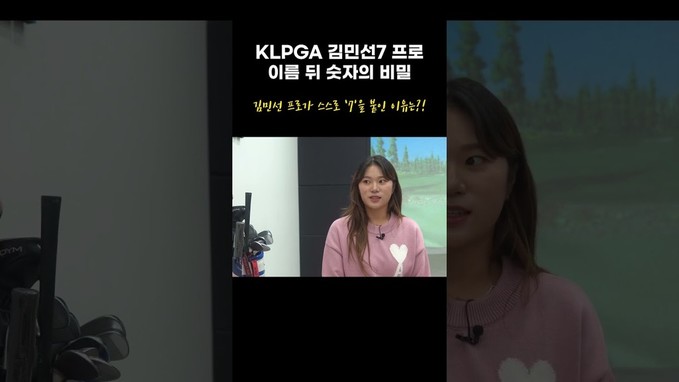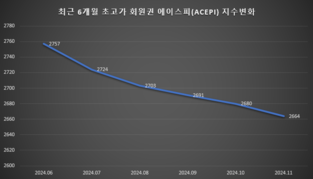단순하고 사소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수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 뛰어다니는 볼 퍼슨은 경기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볼 퍼슨의 시작인 ‘볼 보이’는 약 90여년 전 ‘윔블던’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920년 윔블던은 볼 보이 제도를 시작하면서 14세부터 18세까지의 남학생들을 볼 보이로 기용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볼 보이가 되는 것은 매우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다고 한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는 4대 메이저 대회를 포함한 주요 투어에서 어렵지 않게 볼 퍼슨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도 메이저 대회의 볼 퍼슨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편인데, ‘프랑스오픈’이나 ‘윔블던’ 같은 경우는 볼 퍼슨 지원자에게 5개월 간의 교육을 받게 한 후 이들 중 4분의 1 가량을 볼 퍼슨으로 선정한다.
볼 퍼슨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무척이나 섬세하고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공이 네트에 걸리면 곧장 나와 공을 치우고, 서브 턴의 선수들에게 공을 건네는 일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볼 퍼슨은 경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바른 자세와 복장으로 코트 한 켠에 앉아서 대기하며 움직인다. 오랜 시간 코트에서 머무르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경기에 들어온 선수들의 특성을 알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것 역시 볼 퍼슨에게 요구되는 사항 중 하나다.
이를테면 비너스 윌리엄스(미국)는 서브 때 공을 여러 개가 아닌 단 하나만 가져가기 때문에, 볼 퍼스는 이를 알고 그에게 공을 하나만 건네야 한다.
또한 다른 선수들이 서브 전 베이스 양 사이드 라인에서 볼을 받는 반면 카롤리네 보즈니아키(덴마크)는 자신이 서비스를 넣는 곳에서만 공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볼 퍼슨은 그의 서브 턴에 미리 충분한 공을 가지고 기다리는 식으로 준비한다.
이처럼 대회 내내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볼 퍼슨은 대부분 별도의 페이를 받는 대신 일종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일한다. 테니스 스타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다는 것, 국제 대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영예가 있을 뿐이다.
다만 ‘US오픈’은 2017년 기준 볼 퍼슨에게 시간당 11달러의 페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US오픈’은 타 대회와 달리 볼 퍼슨의 최저 나이만 14세로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볼 퍼슨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회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볼 퍼슨이지만 오늘날 이들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크게 언급되는 것은 볼 퍼슨의 안전 문제다.
 |
| ▲ 사진 : 유튜브 중계 화면 캡처 |
실제로 지난해 ‘윔블던’ 남자 단식 경기 중 볼 퍼슨으로 대기하던 여학생이 닉 키리오스(호주)의 서브로 넘어온 공을 맞으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단순히 팔에 멍이 드는 정도로 끝났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비교적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오랜 시간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점에서 혹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볼 퍼슨은 대개 아침 10시 첫 경기 시작부터 오후 7시, 마지막 경기 종료까지 코트를 지켜야 한다. 상황에 따라 경기가 지연되면 자정이 넘어서까지 코트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볼 퍼슨이 선수들의 감정 표현을 고스란히 받는 감정 노동까지 한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규정 등의 강화로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기가 잘 안 풀리는 선수들이 볼 퍼슨에게 수건을 던지거나 사소한 일에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옐레나 오스타펜코(라트비아)는 2016년 ‘오클랜드 오픈’에서 나오미 브로디(영국)의 공이 쳐내기 어려운 곳으로 날아오자 볼 퍼슨이 서있는 곳으로 라켓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오스타펜코는 경기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성 논란으로 숱한 비난을 받았다.
전통과 영예의 존속, 그리고 현실적인 대우와 안전의 사이에서 볼 퍼슨은 끊임없이 논의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맛보기] KLPGA 유현조 프로의 드라이버 멀리 보내는 비결 공개! 드라이버꿀팁???? #스윙레슨](/news/data/20241121/p179578202005934_104_h2.jpg)